2010.1.11
물리학에서는 사물을 환경에 상관없이 정의하고 그리고 그 사물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나가는가 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본다. 이 방식은 절대로 유일한 시각이거나 모든 경우에 옳은 시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나는 어제 썼었다. 다만 매우 유용한 시각중의 하나일 뿐이다.
같은 이야기를 좀더 해보고 이것이 가치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 다시 세포를 생각해 보자. 세포가 죽어있는 물건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포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세포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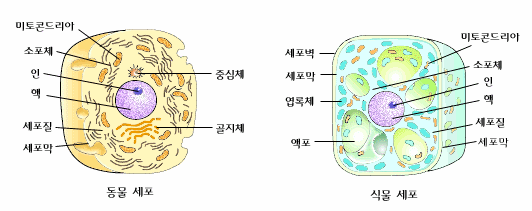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쌓여 있고 그 안에 여러가지 것들이 들어있다. 우리가 말하는 세포는 보통 이 세포막안에 있는 물질들로 정의된다. 우리는 이렇게 세포를 정의하고 세포가 어떻게 다른 바깥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그런데 이 세포막 안에 있는 것들은 제쳐두고 세포막 자체에 주목해 보자. 세포막은 두개의 분자두께정도 밖에 되지않아서 그 두께가 10n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이루는 분자들은 물에 이끌리는 부분과 물에 밀려나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 보이는 모양을 하게 된다.
이쯤까지 내려오고나면 세포를 세포막 바깥쪽의 것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포막은 세포안과 바깥쪽을 나눈다고 말할수도 있지만 실은 세포안과 세포바깥쪽이 균형을 이루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비슷해 보이는 문장들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첫번째 문장에서는 세포막이 먼저 존재한다. 그러니까 세포안과 바깥의 물질에 상관없이 세포막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안과 바깥을 구분짓는다는 느낌이다. 두번째 문장에서는 그 반대다. 세포안과 바깥이 존재하고 그것들의 경계를 가르켜 세포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두번째 방식으로 세포막을 말할 때에는 안과 바깥의 어느 한쪽만을 빼고 존재하는 세포막이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위쪽이 없이 중간과 아래쪽만 존재한다는 식이다.
생명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한가지 성질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주변과 끝임없이 소통한다는 것이다. 생명은 세포막처럼 무른 경계선을 가지는데 그 경계를 뚫고 여러가지가 드나든다. 우리가 끝없이 먹고 배설하며 지구위의 물질을 내 몸안으로 넣었다가 내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이 소통이 지극히 커질 경우에는 사실상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존재 자체의 근거가 희박해 진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는 본래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우리 몸바깥에 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몸을 가르켜 이 물질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애매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만큼이 큰 소통인지의 절대적 구분은 없다. 그런 구분은 임의로 그은 것이다. 그 소통이 비교적 적다고 해도 시간의 스케일을 크게 잡으면 다시 그 소통은 커보일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경우는 물리학에서 쓰는 홀로 존재하는 정의를 도입하는 것이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수소원자는 시간이 지나도 수소원자지만 갓난 아이가 백살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나는 물리학 전공을 한 사람이다. 내 말은 일반물리학적인 시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할때는 아마도 보다 적합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시각이 있을 수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은 서로 대립하는 것들이 균형을 이뤄 형체를 유지하는 사건이라는 시각이다. 서로 대립하는 것들이 단순히 섞여서 흘러가 버리면 거기에는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세포막이 보여주듯이 안과 바깥이 균형을 이뤄 경계를 만들고 그것이 유지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세포라고 부를만한 어떤 것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포란 바깥과 상관없이 정의되어 홀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안과 바깥이 균형을 이룬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고립계적인 시각을 전제하는 물리학의 시각은 유용하지만 때로 문제를 만든다. 환경에 상관없이 먼저 사물을 정의하고 파악하여 그 주변의 환경을 나중에 가져다 놓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잊게 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적인 시각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고 복잡해 보이는 이런 생명의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어머니라는 개념을 제외하고 아들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은 일단 혼자서 존재하고 정의할 수있는 존재인데 그 다음에 환경을 가져다 놓아서 어머니 아들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환경-이경우에는 어머니라는 존재-과 나의 관계는 2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즉 나라는 존재의 핵심과는 무관한 것이다. 내 주변에는 전혀 다른 환경이 놓여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지금은 이런 환경이 놓여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생명적인 시각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나는, 나아가 모든 생명은 세상을 어떻게 둘로 나누던 그 두가지 환경이 균형을 이룬 사건이다. 내가 나인것은 내 안과 바깥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핵심적이다. 그 어느쪽을 떼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중간과 아랫쪽만 있고 위쪽은 다른게 올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다. 중간이란 위와 아래의 사이다.
내가 혼자서 정의되고 존재할 수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세상 모든 것과 관계가 끊어진다. 나는 그것들과 연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들은 의미를 잃는다.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파도가 나는 바다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소리가 나는 공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뜨거움이 나는 차가움과는 상관없이 홀로 존재할 수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나와 내가 아닌것의 경계는 없다. 이세상 모든 것이 나다. 따라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의미나 가치는 연결과 문맥에서 나온다. 우리가 고립계를 전제하는 물리학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생명적인 시각에서 보완할 수 있다. 물리학적 시각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깊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연작 에세이들 > 생명과 환원주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속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생명 (0) | 2010.04.20 |
|---|---|
| 4. 환원론적 시각과 세계에 대한 무관심 (0) | 2010.01.12 |
| 3. 물리적 세계관의 현실적인 문제 (0) | 2010.01.12 |
| 1. 물질과 생명 (0) | 2010.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