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27
날마다 조금씩 읽고 있는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은 나를 지겹게 했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 단순명료하게 말해서 따분하기 때문이다. 괴테를 읽는데 지친 나는 아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었다. 거의 앉은 자리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읽을 수 있을만큼 집중하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괴테가 주는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아내가 빌린 것이긴 하지만 공중그네나 남쪽을 튀어같은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오쿠다 히데오의 책이다. 알고 보니 이 소설은 그의 데뷰소설이었다.
오쿠다 히데오의 책은 읽기 쉬우면서도 재미가 있다.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는 소설들이다. 그의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변과 부조화를 이룬다. 뭐랄까 얌전하게 규칙을 지키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논리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쿠다 히데오는 저항감이 있는 것같다. 그래서 그의 소설을 읽다보면 왜 이러면 안돼? 하는 질문을 계속 듣는 듯한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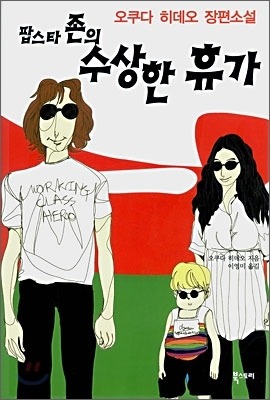
이런 느낌에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 작가의 힘이다. 덕분에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그 소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좋아 좋아 우리 더 화려하게 갈데까지 가보자구' 하는 식의 마음가짐이 되어 납득을 하게 된다. 유령이 나오건 변태가 나오건 우주인이 나오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좋다.
독자를 글쓰는 사람과 한편으로 만드는 능력이란 건 굉장하다. 작가가 글자를 틀리건 스토리가 이상하게 되건 독자는 '뭐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는 꼼꼼하게 따져서 비판하는 사람도 말이다. 오쿠다 히데오는 부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루하게 읽지만 유명한 고전인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과의 비교는 오쿠다 히데오와 괴테간의 시간적 문화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독일 작가 괴테는 1786년에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여행기를 쓴다. 오쿠다 히데오는 일본에서 2000년에 이 소설을 썼다. 괴테의 글은 물론 소설이 아니라 여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객관적 묘사가 넘쳐난다. 적어도 요즘 기준으로 보면 작가또는 관찰자의 내면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작다. 그러나 당시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당시의 획기적인 자기 묘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쿠다 히데오의 글을 보면 소설은 거의 인간의 머리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처럼 읽혀진다. 꿈과 현실은 잘 구분되지 않으며 공중그네에서도 그랬듯이 이 책에서도 정신과 심리치료가 등장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아픔이나 변비를 겪는 주인공 존의 문제는 육체적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인 것이다.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은 문제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찾는다. 객관적 진리를 찾아 헤매는 고전시대와는 당연히 큰 간격이 있다.
이 소설은 일본인 여자와 결혼했던 존 레논의 삶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 낸 소설이다. 즉 그가 총에 맞아 죽기전 몇년전에 여름마다 시간을 보냈던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상상이다. 이 소설에서도 오쿠다 히데오는 우리를 먼저 유쾌하게 만든다. 그의 메세지는 언제나라고 할만큼 자주 괜찮아 괜찮아를 외치는 것이다. 여러가지 인생걱정에 주눅이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어때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도 그런 장면이 여러가지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는 이것이다. 변이 안나와서 고민하는 존에게 의사는 계속해서 말한다. 변이 안나오면 어때요? 변따위는 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그건 말도 안된다고 말하는 존에게 의사는 계속 그렇게 말한다. 물론 이 말들은 단순히 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변비나 똥에 대한 농담이 많다. 그런 이야기는 엄숙한 우리들에게 그래봐야 우리도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변비가 주제라는 것은 주인공 존을 우스꽝스러운 꼴로 만든다. 세계평화를 위해 고민하면서 고통을 받는 성인이 아니라 변비에 고민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비올때 밖에 나가서 진창에 일단 바지를 망치면 이왕 망친 거 아무러면 어때하는 식이 된다. 마찬가지로 오쿠다 히데오를 읽고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그 체면이나 규칙이란게 망가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점점 어 이러면 곤란한데 같은 생각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몰라, 체면은 이미 다 구겨졌는데 아무래면 어때가 되고 마지막에는 작가가 말하는 뭐가 되었든 다 괜찮다는 말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쿠다 히데오를 읽으면 좋을 것이다. 답은 찾지 못한다. 그러나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좀 가벼워 질 것이 분명하다.
'독서와 글쓰기 > 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솔 프램튼의 내가 고양이를 데리고 노는 것일가, 고양이가 나를 데리고 노는 것일까?를 읽고 (0) | 2015.04.12 |
|---|---|
| 케이티 버틀러의 죽음을 원할 자유를 읽고 (0) | 2015.04.03 |
| 아트 슈피겔만의 쥐를 읽고 (0) | 2015.03.13 |
| 프랭크 도나휴의 최후의 교수들을 읽고 (0) | 2015.01.14 |
| 로버트 퍼시그의 라일라를 읽고 (0) | 2014.09.29 |




댓글